얼마만의.. 글쓰기? 너무 게을렀던 것 아닌지..
우선 전시의 서문이라던가 작품에 대한 안내글이 명확해서 좋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비디오'라는 테크놀로지적 예술 형식이 기존의 전통적 형식과 결합된 것부터 시대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시간을 축으로 섹션을 나누면서 '어떻게'라는 기술적인 변천사 안에서 피어난 예술의 흐름까지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비디오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구성에서 젓 착품이 Lawrence Weiner의 개념작업이라는 점이 절묘하고 전시의 맥락을 잘 정리한다. <To and fro. Fro and to. And to and fro. And fro and to.>는 재떨이를 움직이며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나레이션을 한다. 마지막 나레이션인 "It offers not how it should were it to but how it could were it to."로 작품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가 아닌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영상매체가 그러하다. 기록의 장치로써만 존재하는가 하면 완전히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Lynda Benglis의 <Mumble>. 1차적으로 인물을 찍는 모니터 앞에 한명의 사람이 서 있고, 그 사람까지 촬영해 두개의 레이어를 만든 작업. 도록에서는 '주의 분산 미학'이라고 나왔지만 그보다는 영상매체가 가진 가장 큰 차별요소인 프레임을 이용한 초기의 작업 같이 보인다. 다만 이런 이미지의 혼재를 사운드와도 일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공백이 조금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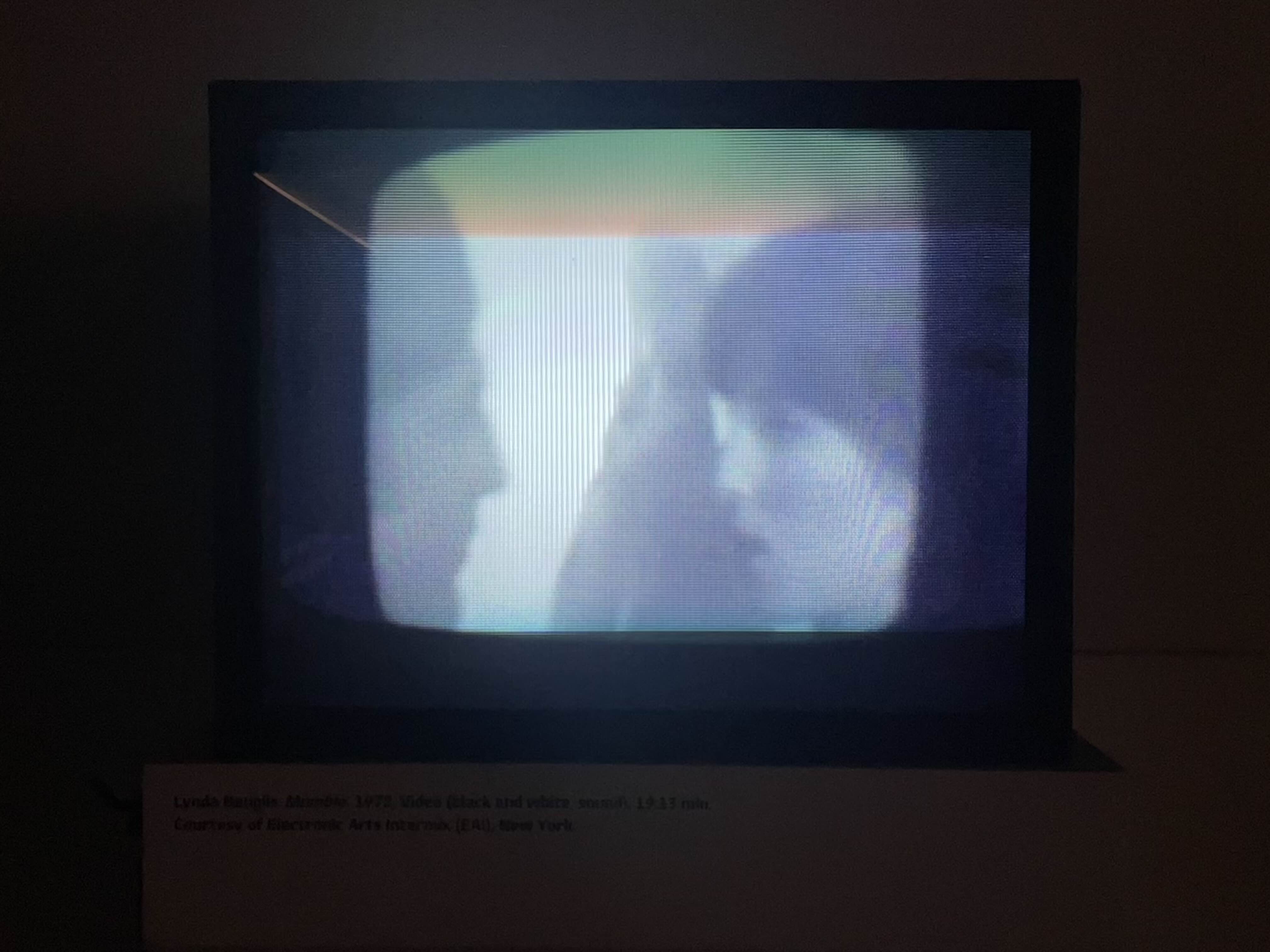
'영상' 이미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진이미지와는 다른, 어쩌면 그래픽적인? 것들. 마치 음악과 같이 시간성이 필수적일지도.
정여름 작가의 작업들처럼 스틸 이미지와 나레이션-인터뷰-를 혼합하는 간단한 방식만으로 기록이 아닌 작품이 될 수 있다. 촬조스터디 아웃풋을 이런 형식으로 하나의 작업물로 만들어보고 싶다. Ulisses Jenkins의 <King David>는 인터뷰 음성에 대상의 이미지가 아닌 작업물을 비춘다. 인터뷰 음성이 끝나고 작업물이 있는 장소에 흘러나오는 음악이 영화에 이어질 때, 영화의 위치도 변화한다. 영상매체의 특성을 이용한 '실험'에서 체험적인 성격으로 변해 기록물이 된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활자화시킨 생각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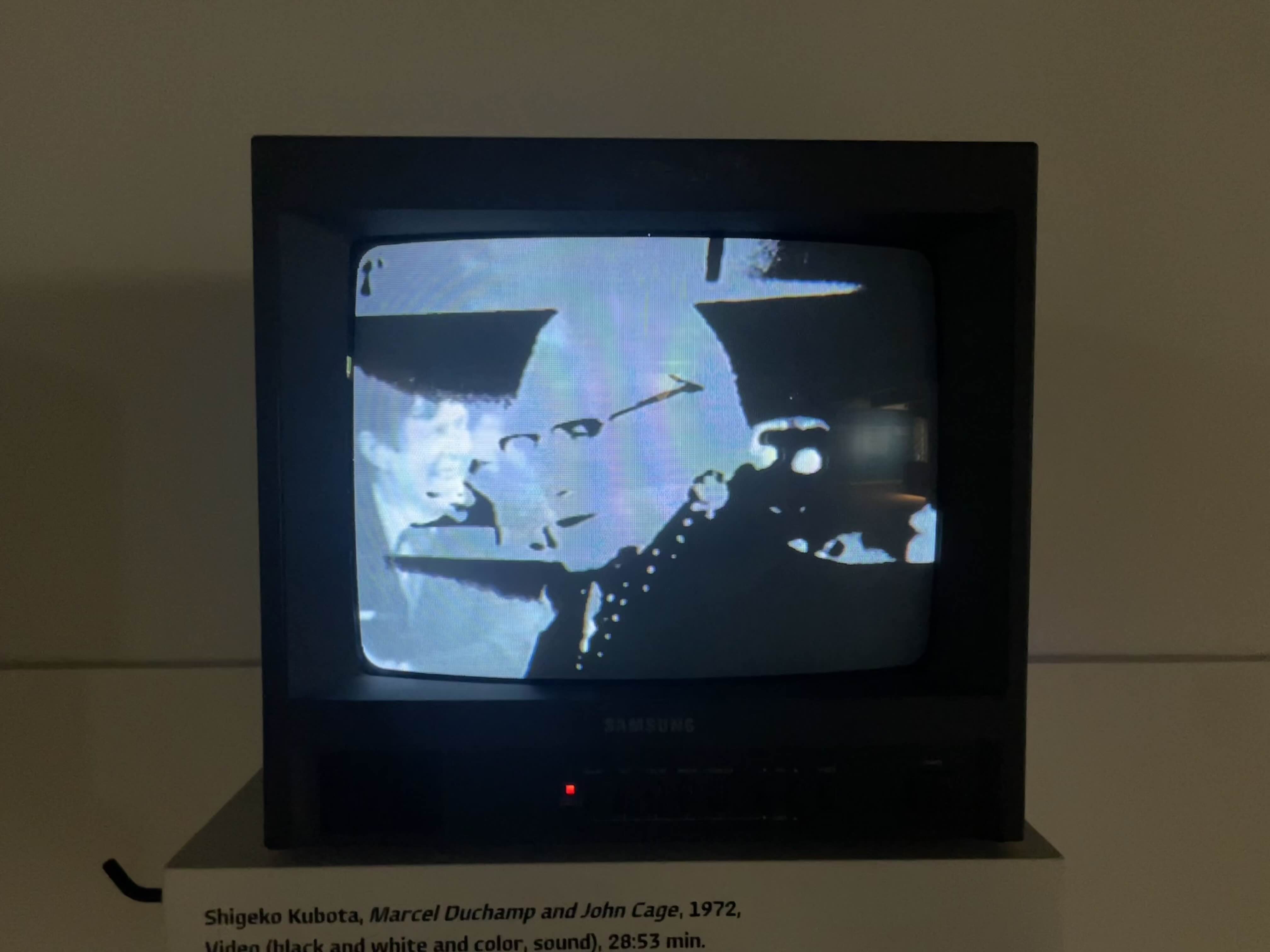
캐롤리 슈니먼의 신체 퍼포먼스. 예상외로 신체를 그래픽적으로 활용한 '이미지'에 집중된 작업이었다.
플럼 라인. 전시를 보며 개념작업, 구조주의, 신체의 활용 등 여러 예술 사조나 개념에 대해 알아야 말 그대로 '실험'으로써의 예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작업들은 확실히 창작자로써의 접근성은 좋지만... 애초에 이런 개념들이 탑재되어야 시도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플럼 라인>은 내가 자주 접하는 실험영화(조금 더 기록적이고 이미지적인 성격)와 비슷한 계열이었다. 푸티지 자체는 일상적이지만 변형이 많이 되었고, 그 변형에서 작가의 심경이 잘 느껴지는 것도 신기했다. 푸티지 자체를 내용으로 이용하고, 변형(해체)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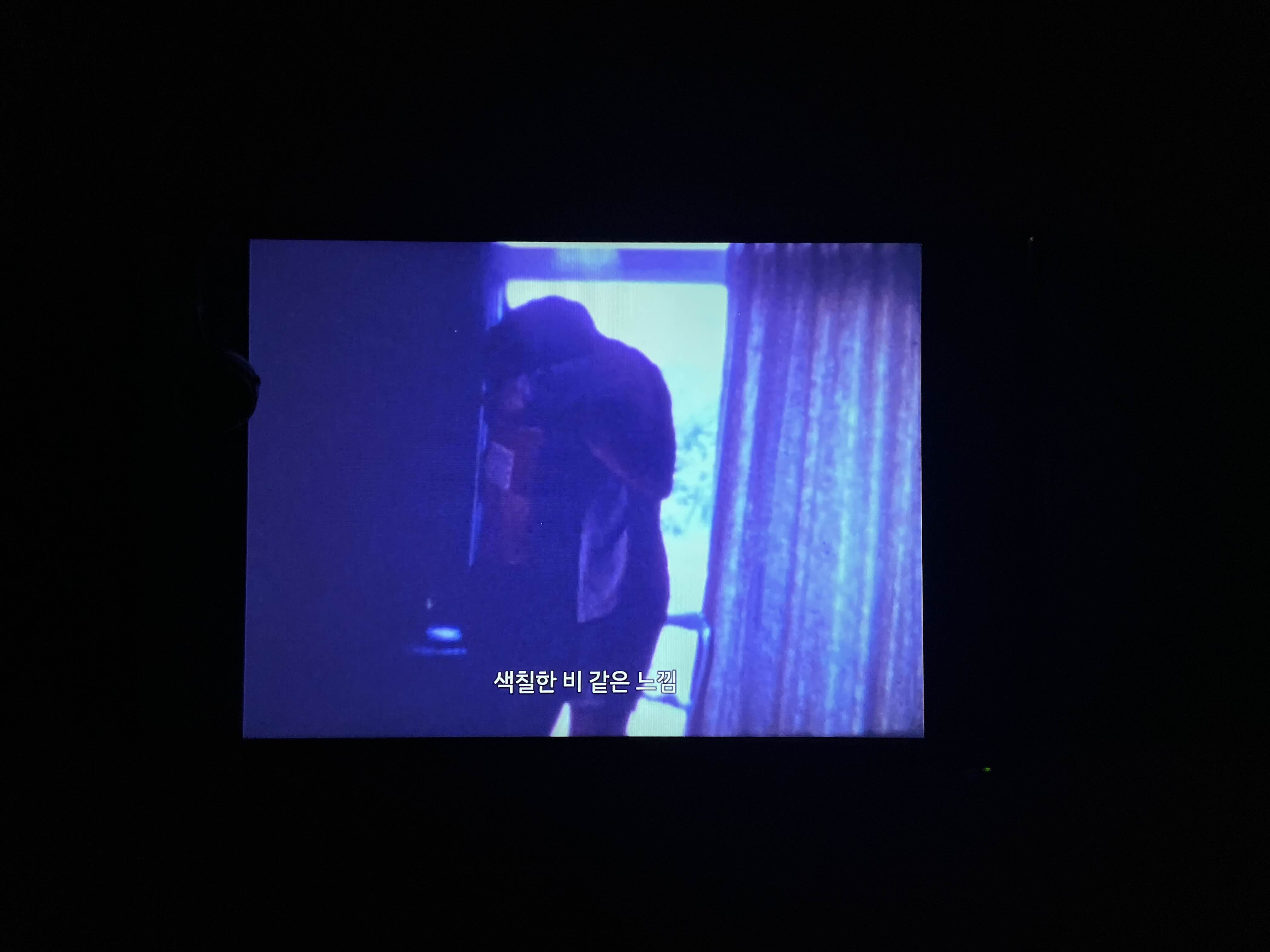

오랜만에 사소한 작업들을 보니.. 나도 뭐라도 깔짝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전시회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윌리엄 클라인 : DEAR FOLKS, (0) | 2023.08.24 |
|---|---|
| 울리 지그 중국 현대미술 컬렉션전 (0) | 2023.05.12 |
| Drift : In Sync with the Earth, 2023 (0) | 2023.03.03 |
| 패터 바이벨 : 인지 행위로서의 예술, 2023 (0) | 2023.02.11 |
| 에르빈 브룸 : 나만 없어 조각, 2022 (0) | 2023.01.22 |